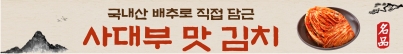‘손 수(手), 두드릴 타(打)’라는 뜻을 가진 수타면(手打麵)은 기계가 아닌 손의 힘으로 반죽을 쳐서 만든 면을 말한다. 이처럼 ‘두드린다’는 의미의 한자 ‘타(打)’는 음식뿐 아니라 건설 분야에서도 익숙한 용어로 쓰인다. 콘크리트 시공에서 사용하는 ‘타설(打設)’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붓고 진동기로 다지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왜 여전히 ‘치고 두드린다’는 의미의 타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시공의 역사적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다. 1919년 일본 오노다(小野田)시멘트는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리에 연산 6만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콘크리트 시공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믹서나 펌프 등 기계화 설비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시멘트와 모래는 질통으로 운반해 철판 위에 펼친 뒤 건식으로 비볐고, 이후 자갈과 물을 넣어 삽으로 여러 차례 뒤집으며 혼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구조체에 밀어 넣은 뒤, 인력으로 다짐하는 방식으로 시공됐다.
문제는 당시 시멘트의 품질과 비용이었다. 분말도가 낮아 초기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가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 기술자들은 물 사용량을 최소화한 ‘된비빔 콘크리트’를 요구했다. 그러나 되게 비빈 콘크리트는 충분히 다져주지 않으면 재료 분리와 공극이 발생해 구조체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는 철근, 몽둥이, 달고 등 각종 도구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치고, 때리고, 두드리며 다짐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져 표면에 물이 배어 나올 때까지 반복해 다지는 것이 필수였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를 때린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타설’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됐다.
현재는 콘크리트를 비교적 묽게 배합하고, 바이브레이터로 진동 다짐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타설’이라는 표현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실제로 콘크리트학회 용어위원회에서는 ‘타설’ 대신 ‘부어넣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는 ‘타설’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비록 현재는 과거처럼 직접 두드리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지만, 콘크리트를 철저히 다져야만 양질의 구조체가 완성된다는 시공의 본질적 중요성을 함께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방 이후 과도기 시절 국내 기술과 관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점검이나 안전진단 과정에서 코어를 채취하면 다짐 불량으로 인한 큰 공극이 발견되거나, 코어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쉽게 파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콘크리트가 본래의 강도를 거의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됐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타설’의 의미를 단순한 공정 용어가 아닌, 콘크리트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콘크리트를 얼마나 치밀하게 다져 구조체로 완성하느냐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건설 품질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현대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붓고 진동기로 다지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왜 여전히 ‘치고 두드린다’는 의미의 타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시공의 역사적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다. 1919년 일본 오노다(小野田)시멘트는 평안남도 강동군 승호리에 연산 6만톤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콘크리트 시공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믹서나 펌프 등 기계화 설비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시멘트와 모래는 질통으로 운반해 철판 위에 펼친 뒤 건식으로 비볐고, 이후 자갈과 물을 넣어 삽으로 여러 차례 뒤집으며 혼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크리트는 구조체에 밀어 넣은 뒤, 인력으로 다짐하는 방식으로 시공됐다.
|
문제는 당시 시멘트의 품질과 비용이었다. 분말도가 낮아 초기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고가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 기술자들은 물 사용량을 최소화한 ‘된비빔 콘크리트’를 요구했다. 그러나 되게 비빈 콘크리트는 충분히 다져주지 않으면 재료 분리와 공극이 발생해 구조체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는 철근, 몽둥이, 달고 등 각종 도구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치고, 때리고, 두드리며 다짐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져 표면에 물이 배어 나올 때까지 반복해 다지는 것이 필수였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를 때린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타설’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됐다.
현재는 콘크리트를 비교적 묽게 배합하고, 바이브레이터로 진동 다짐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타설’이라는 표현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실제로 콘크리트학회 용어위원회에서는 ‘타설’ 대신 ‘부어넣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는 ‘타설’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비록 현재는 과거처럼 직접 두드리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지만, 콘크리트를 철저히 다져야만 양질의 구조체가 완성된다는 시공의 본질적 중요성을 함께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방 이후 과도기 시절 국내 기술과 관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기점검이나 안전진단 과정에서 코어를 채취하면 다짐 불량으로 인한 큰 공극이 발견되거나, 코어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쉽게 파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콘크리트가 본래의 강도를 거의 발휘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됐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타설’의 의미를 단순한 공정 용어가 아닌, 콘크리트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콘크리트를 얼마나 치밀하게 다져 구조체로 완성하느냐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건설 품질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