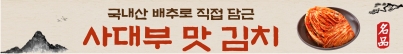한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 원인은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출산율 1.2%의 일본과 0.72%인 한국의 결혼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일찍 결혼한다(20대 남자 결혼율: 한국 7%, 일본 23%).
왜 그럴까? 일본인들은 결혼하면 대개 작은 집에 세 들어 사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국인은 결혼할 때 집을 얻기 위해 큰돈을 모아야하므로 결혼이 늦어진다. 따라서 평균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진다.
일본 대학생들은 4학년 1학기에 대부분 취직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졸업 전에 취직하기가 어렵다. 취직하기 위해 외국어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서 능력을 높여야 하므로 취직과 결혼이 늦어진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한국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저렴하다. 대학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다. 한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일본의 두 배에 가깝다.
신혼부부가 구하는 아파트의 구매 가격이 동경에서 5억 원 정도라면, 서울에서는 10억 원(비강남권 20평대)이다. 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은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전국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많이 지원한다. 이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는 해마다 늘어난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주택 가격이 치솟는다. 군나르 뮈르달(1974년 스웨덴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은 주택 가격의 높은 상승은 합계출산율을 크게 감소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왜 한국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 일본은 근대화 초기에 전국에 7개의 제국대학을 설립하고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7개 대학들이 모두 질적으로 우수하다. 한국은 지방국립대학들을 설립하고 부실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따라서 지방 학생들은 서울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려들게 마련이다.
일본 학생들이 1차적으로 7개 제국대학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한국 학생들은 1개 국립대학을 목표로 공부한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일본에 비해 7배 높은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 결과 초등학생부터 입시 지옥에 시달린다. 일본은 일류대학이 많기 때문에 공부 경쟁이 한국처럼 치열하지 않다. 서울 인구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18%이다(동경은 11%)이다.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일자리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지방 분산을 권하지만 기업들은 가지 않는다.
모든 권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수도권이 비대해진다. 최저임금도 선진국들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는데 한국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한다.
지방 국립대학을 서울대학 이상으로 충분히 지원해서 시설, 교수 인력 등을 대폭 향상시키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기업들도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에 투자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중앙 권력의 분산과 지방대학 육성에 있다.
왜 그럴까? 일본인들은 결혼하면 대개 작은 집에 세 들어 사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국인은 결혼할 때 집을 얻기 위해 큰돈을 모아야하므로 결혼이 늦어진다. 따라서 평균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진다.
일본 대학생들은 4학년 1학기에 대부분 취직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졸업 전에 취직하기가 어렵다. 취직하기 위해 외국어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서 능력을 높여야 하므로 취직과 결혼이 늦어진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한국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저렴하다. 대학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렵다. 한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일본의 두 배에 가깝다.
신혼부부가 구하는 아파트의 구매 가격이 동경에서 5억 원 정도라면, 서울에서는 10억 원(비강남권 20평대)이다. 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은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전국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많이 지원한다. 이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는 해마다 늘어난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주택 가격이 치솟는다. 군나르 뮈르달(1974년 스웨덴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은 주택 가격의 높은 상승은 합계출산율을 크게 감소한다고 경고한바 있다.
왜 한국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 일본은 근대화 초기에 전국에 7개의 제국대학을 설립하고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7개 대학들이 모두 질적으로 우수하다. 한국은 지방국립대학들을 설립하고 부실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따라서 지방 학생들은 서울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려들게 마련이다.
일본 학생들이 1차적으로 7개 제국대학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한국 학생들은 1개 국립대학을 목표로 공부한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일본에 비해 7배 높은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 결과 초등학생부터 입시 지옥에 시달린다. 일본은 일류대학이 많기 때문에 공부 경쟁이 한국처럼 치열하지 않다. 서울 인구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18%이다(동경은 11%)이다.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일자리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지방 분산을 권하지만 기업들은 가지 않는다.
모든 권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될수록 수도권이 비대해진다. 최저임금도 선진국들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결정하는데 한국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한다.
지방 국립대학을 서울대학 이상으로 충분히 지원해서 시설, 교수 인력 등을 대폭 향상시키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다. 기업들도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에 투자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중앙 권력의 분산과 지방대학 육성에 있다.
이병욱 가천대 명예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