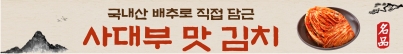일반인들은 한 덩어리로 부어 넣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균열 없이 멋있는 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가 물에 의해 굳어지는 수경성 재료라고 하는 숙명 때문에 균열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균열문제는 콘크리트의 재질, 건설계획, 구조설계 등에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음에도 이제까지는 주로 콘크리트 재질과 관련한 건설 시공자 관점에서만 검토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원고는 설계자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균열을 만드는 균열유발 줄눈인 수축 줄눈에 대하여 기술해 본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이음매인 줄눈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신축 거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한 기능성 줄눈과 시공과정에서 구분되어 타설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일체화 되기를 요구하는 시공줄눈이 있다. 각 줄눈의 명칭 및 특성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그런데, 이중 사진 1과 같은 지하실 흙막이 벽과 같은 경우, 일정 간격의 수직 방향 관통균열이 발생함으로써 미관 손상, 누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시공자를 괴롭히게 되는데, 균열원인으로서는 외부구속 수화열, 건조수축 응력, 기온변화에 따른 길이변화 등이 있지만, 매스 콘크리트가 아니라면 건조수축 응력이 제일 크게 문제 시 된다.
즉, 콘크리트의 건조수축량은 4~8×10-4 정도인데,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벽에서는 철근구속 등을 고려하여 절반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면, 많은 균열이 발생하고 난 후 10m당 2~4mm 정도는 균열을 만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와 같은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0.02mm 이하의 소폭 균열로부터 1~2mm 정도인 큰 폭의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품질 재료사용, 유동화제에 의한 단위수량 저감, 팽창재 사용 등의 노력으로 가능한 한 줄일 수는 있으나 완전히 균열이 없는 무균열 콘크리트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설계대책으로 벽면에 미리 줄눈을 넣어 균열을 유발하여 그곳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여러 기능성 줄눈 중 특히 수축 줄눈(Contraction joint)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건조수축 등 구조물에 발생하는 수축균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줄눈은 외벽의 내·외쪽 혹은 한쪽에 보통 3m 정도의 간격으로 25mm 정도의 홈으로 설치한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벽면이 수축해도 단면결손 된 홈 부근이 먼저 인장응력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줄눈의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줄눈에 집중된 균열은 폭이 넓어지기는 할지라도 그 인근 부분에는 인장응력에 의한 구속이 작으므로 줄눈 이외의 장소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큰 균열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 줄눈으로부터 우수 및 지하수가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압이 큰 경우는 중앙에 그림 1과 같은 지수판을 설치하고 표면을 탄성실링재 및 기타로 마무리하는데, 간단한 우수나 수압이 약한 경우는 양쪽 또는 한쪽에 실링재를 채워 주게 된다.
단, 홈의 깊이는 표면에 흉내만 내어서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균열이 그곳에서 유도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상적인 홈의 깊이는 양면일 경우는 양면 합계로 벽두께의 1/4 이상이 좋고, 적어도 1/5 이상이 되지 않으면(20~25%의 단면결손) 효과가 작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줄눈 간격도 3m보다 너무 크게 하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이음매인 줄눈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신축 거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한 기능성 줄눈과 시공과정에서 구분되어 타설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일체화 되기를 요구하는 시공줄눈이 있다. 각 줄눈의 명칭 및 특성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그런데, 이중 사진 1과 같은 지하실 흙막이 벽과 같은 경우, 일정 간격의 수직 방향 관통균열이 발생함으로써 미관 손상, 누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시공자를 괴롭히게 되는데, 균열원인으로서는 외부구속 수화열, 건조수축 응력, 기온변화에 따른 길이변화 등이 있지만, 매스 콘크리트가 아니라면 건조수축 응력이 제일 크게 문제 시 된다.
|
즉, 콘크리트의 건조수축량은 4~8×10-4 정도인데,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벽에서는 철근구속 등을 고려하여 절반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면, 많은 균열이 발생하고 난 후 10m당 2~4mm 정도는 균열을 만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와 같은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0.02mm 이하의 소폭 균열로부터 1~2mm 정도인 큰 폭의 균열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품질 재료사용, 유동화제에 의한 단위수량 저감, 팽창재 사용 등의 노력으로 가능한 한 줄일 수는 있으나 완전히 균열이 없는 무균열 콘크리트는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설계대책으로 벽면에 미리 줄눈을 넣어 균열을 유발하여 그곳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여러 기능성 줄눈 중 특히 수축 줄눈(Contraction joint)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건조수축 등 구조물에 발생하는 수축균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줄눈은 외벽의 내·외쪽 혹은 한쪽에 보통 3m 정도의 간격으로 25mm 정도의 홈으로 설치한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벽면이 수축해도 단면결손 된 홈 부근이 먼저 인장응력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줄눈의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줄눈에 집중된 균열은 폭이 넓어지기는 할지라도 그 인근 부분에는 인장응력에 의한 구속이 작으므로 줄눈 이외의 장소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큰 균열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 줄눈으로부터 우수 및 지하수가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압이 큰 경우는 중앙에 그림 1과 같은 지수판을 설치하고 표면을 탄성실링재 및 기타로 마무리하는데, 간단한 우수나 수압이 약한 경우는 양쪽 또는 한쪽에 실링재를 채워 주게 된다.
|
단, 홈의 깊이는 표면에 흉내만 내어서는 의미가 없고, 반드시 균열이 그곳에서 유도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상적인 홈의 깊이는 양면일 경우는 양면 합계로 벽두께의 1/4 이상이 좋고, 적어도 1/5 이상이 되지 않으면(20~25%의 단면결손) 효과가 작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줄눈 간격도 3m보다 너무 크게 하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
<저작권자 경제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